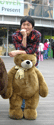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직업으로 하면서 산다는 건 얼마가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일까? 상상만으로도 흐뭇해진다.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었다. 무슨 일이든 그 시작에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를 갔었다. 그곳은 장애인 생활시설이었다. 장애인을 처음 대한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팔과 다리는 서로 뒤엉켜 있는 아이, 자기 머리를 계속 주먹으로 때리는 아이,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 등등...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하니 서있을 때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똥을 싸서 뭉개버린 바지를 갈아입히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이를 씻기고 있었다. 또 한 번 충격이었다. 다른 직원들 또한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겁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느새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왜 갑자기 생판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을 하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한번 사는 인생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설득하며 내 자신도 합리화시켰다.
복지관에 처음 입사해서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을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활개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전문성이다. 내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어보자. 전문가가 되어보자!
그렇게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을 파견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게끔 일상생활에 요소요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입사 후 몇 달간은 정말이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원하는 욕구에 맞춰 적절한 보조인을 파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이용자의 입장과 보조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양자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을 시험하는 잣대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직원으로서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내가 관리하던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을 만큼 큰 사고였다. 팀장님과 함께 사고를 해결하던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날도 팀장님과 밤늦은 시간에 간신히 저녁 한 술을 비우며 신세 한탄도 해보고 ‘다 잘 될 꺼야’ 주문도 걸어보았지만 쉽게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 이건 나의 부족함이 다른 이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는지라고 드는 자괴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초겨울, 익숙한 일터이거나 생존경쟁의 장 속에서 담배 한 개비에 시린 공기를 뼛속까지 뿜었다 내보내며 잠시라도 여행자가 머무는 강원도의 눈 덮인 산골을 동경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건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람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비춰질 멋진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길 꿈꾸며 수많은 모음과 자음 속에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본다.


